청어는 오랫동안 세계인의 주식이 되어온 생선이다. 요즘 한국에선 청어를 해풍에 말려 김과 미역, 마늘 등 채소와 함께 싸먹는 과메기가 대표적인 요리지만, 전통적으로 다양한 요리법이 전해 내려온다. 쫀득한 식감과 기름진 고소함이 겨울철 별미로 꼽혀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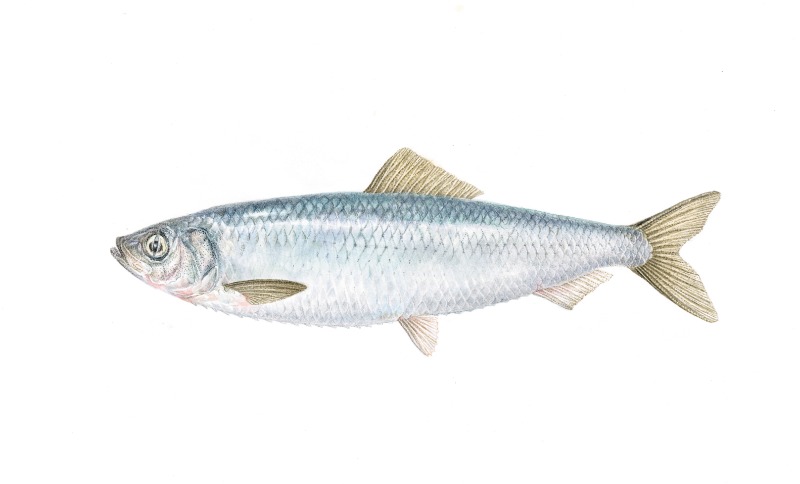
청어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생선이다. 몸의 폭이 좁고 높이가 높은데, 등쪽은 암청색, 중앙부터 배쪽까지는 은백색인 등푸른 생선의 한 종류이다. 수온 2∼10℃, 수심 0∼150m의 한류가 흐르는 연안에서 무리를 이루어 서식한다. 한반도 연안의 청어 수확량은 매우 불규칙한데, 올 겨울에는 풍어를 기록하고 있다.
“맛 좋기로는 청어, 많이 먹기로는 명태” 라는 말이 전해온다. 한국인의 밥상에 오르는 대표적인 생선 세 가지 — 대구, 명태, 청어 —중 맛으로는 청어가 으뜸이라는 뜻이다.
말 그대로‘몸이 푸른 물고기’라는 뜻의 청어는 여러 종이 거대한 무리를 지어 바다 곳곳을 다닌다. 북유럽에서 즐겨 먹는 청어는 북대서양 청어(Clupea harengus)이고, 동북아시아와 북미에서는 태평양 청어(Clupea pallasii)를 잡는다.
흰 살 생선인 대구나 명태는 지방이 적지만 청어 살의 지방은 많게는 20퍼센트에 달할 만큼 기름지다. 냉수성 어종으로 겨울부터 봄이 산란기이고 늦가을부터 기름기가 차오른다. 그 밖에도 글리신, 알라닌처럼 단맛을 내는 유리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다.
1803년 김려(金鑢 1766~1821)가 쓴 한국 최초의 어보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 Rare Fish in the Jinhae Sea)에는 청어의 맛이 “달고 연하며,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다”라고 했다. 요리사이자 작가인 박찬일(朴贊日 1965~)이 경험한 청어 맛도 이와 비슷하다. 그는 자신의 책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에서 속초 바닷가의 막횟집에서 친구와 먹은 청어구이에 대해 “바람이 사나운 겨울날 굵은 소금을 뿌려 숯불 위에 구운 청어 살은 부드럽고 달았다”고 회상했다.
요리법
청어를 먹는 방법은 다양하다. 주산지인 동해안에서는 날것 그대로 회나 회무침으로 먹는데, 때로는 끓인 청어살을 체로 걸러 멥쌀을 넣고 죽을 쑤기도 하고 밀가루와 달걀을 씌워 지진 뒤 장국에 끓여 찜으로 먹기도 한다. 동남 해안을 낀 경상도 지방에서는 찌개로 끓여 먹기도 한다. 서남쪽 전라도 지방에서는 많은 양의 청어를 조리할 때 가마에 물을 붓고 끓여 수증기로 쪄서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하지만 청어는 구워 먹을 때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굵은 소금을 뿌려 노릇하게 구우면 부드럽고 달며 고소하다. 박찬일 요리사는 “기름이 많은 생선이라 구우면 자글자글하게 기름이 배어 맛이 기가 막히다”고 설명했다.
바닷물고기에는 바닷물과 체내 염도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인 트라이메틸아민옥사이드(TAMO: trimethylamine oxide)가 들어있다. 이 화합물이 미생물에 의해 트리메틸아민(TMA: trimethylamine)으로 분해되면 비린내를 풍긴다. 겨울철 기름기가 그득한 청어에는 다가불포화지방산(polyhydric fatty acid)이 많이 들어있어 쉽게 산패된다. 이로 인해 비린내가 더 강해지는데, 청어로 찌개를 끓일 때 된장을 풀거나 구울 때 된장을 바르면 비린내가 줄어든다. 된장 속 향기 물질이 비린내가 덜 느껴지도록 하고 된장의 주성분인 단백질이 비린내 성분과 결합하여 휘발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청어의 다양한 조리법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실제로 1996년 1월 27일 동아일보에는 “청어 지짐이, 청어 조림, 청어젓, 청어백숙 같은 경기도식 요리를 요즘은 거의 볼 수 없다”는 기사가 실렸다.
다양한 청어 요리를 맛보기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청어가 있다가 없다가 한다는 것이다. 청어 수확량은 오래 전부터 들쭉날쭉했다. 찬물을 따라 떼로 몰려다니는 청어는 잡힐 때는 최다 어획류의 하나로 꼽힐 정도였다. 그러다가 잡히지 않을 때는 10여 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기도 했다. 임진왜란을 회고한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징비록>(懲毖錄, A Record of Penitence and Warning)에는 전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난 기이한 일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동해의 물고기가 서해에서 나고 점차 한강까지 이르렀으며, 원래 해주에서 나던 청어가 최근 10년이 넘도록 전혀 나지 않고 요동 바다(遼海)로 이동하여 나니 요동사람들이 이를 신어(新魚)라고 일컬었다.”
비슷한 시기인 1614년 이수광(李睟光 1563~1629)이 쓴 백과사전적 저서 <지봉유설>(芝峰類說, Topical Discussions of Jibong)에도 비슷한 설명이 나온다. 봄철 서남해에서 항상 많이 잡히던 청어가 무려 40여 년 동안 전혀 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장군의 <난중일기>(亂中日記, War Diary)에는 청어를 잡아 군량미와 바꾸었다는 기록이 나오기도 한다.
실학자 이익(李瀷 1681~1764)은 자신의 책 <성호사설>(星湖僿說, Miscellaneous Explanations of Seongho)에서 류성룡의 <징비록>을 인용하면서 이후 상황을 설명한다. 유성룡이 <징비록>을 쓴 당시에는 오직 황해도 해주에만 청어가 있었지만 이제는 조선 바다 전역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청어가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함경도에서 생산”되고 “봄이 되면 차츰 전라도와 충청도로 옮겨 간다. 봄과 여름 사이에는 황해도에서 생산되는데, 차츰 서쪽으로 옮겨가면서 점점 잘아지고 흔해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먹지 않는 이가 없다”고 기록했다.

청어를 겨울 바닷바람에 말린 과메기는 쫀득한 식감과 입 안 가득 퍼지는 어유(魚油)의 고소함이 일품으로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다. 잘 말린 청어를 잘게 잘라 마늘, 고추, 마늘쫑 등을 채 썰어 미역이나 김에 싸 먹는다.
ⓒGETTY IMAGES
과메기

겨울로 접어들면 경북 영덕을 비롯한 동해연안의 해촌에선 청어를 말리느라 분주하다. 대가리를 잘라내고 겨울철 해풍에 얼렸다 녹혔다를 반복하면 비리지 않고 고소한 과메기가 된다.
ⓒ전재호
이익은 시대별로 어획량이 크게 변하고 잡히는 지역조차 달라진 것은 청어가 변화하는 풍토와 기후를 따라다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250여 년 전 이야기이지만 그의 추측은 옳았다. 국립수산과학원이 1970년부터 2019년 사이 한반도 연안의 청어 어획량을 분석한 결과 동해에서는 수온이 오를수록 어획량이 증가한 반면, 서해의 어획량은 수온이 오를수록 감소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지난 50년 동안 청어의 어획량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5천 톤 내외로 잡히다가 중반 들어 1천 톤 밑으로 떨어졌다. 1980년대 말부터 다시 증가하면서 1999년에 정점으로 2만 톤을 찍고는 다시 2002년에 2천 톤 아래로 내려갔다. 2000년대 중반 다시 어획량이 급증해서 2008년에는 무려 4만 5천 톤이 잡혔다. 이듬해에도 청어 대풍은 이어졌다. 2009년 12월 20일 KBS 뉴스는 사라진 청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류성 어종인 청어가 동해뿐만 아니라 물이 따뜻한 동남해와 남해안 일대에서도 많이 잡히면서 경북 영덕에서 청어 과메기를 다시 만들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1960년대 이후 청어가 잘 잡히지 않으면서 주로 경북 해안 지방에서 꽁치로 과메기를 만들게 되었지만 원래 과메기는 청어를 말려 만들었다. 어류학자 정문기(鄭文基 1898~1995)가 1939년 5월 9일 동아일보에 쓴 칼럼에 보면 “청어 다산지인 경상북도에서는 소건한 청어를 ‘과미기’라고 칭하고, 지방특산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수산물”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이처럼 1930년대만 해도 경상북도 해안은 청어의 주산지였다. 요즘에는 과메기를 배추 같은 채소나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초로 쌈을 싸먹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에는 불에 구워먹기도 했고 쑥국을 끓여 먹기도 했다.
과메기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는 분명치 않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 (徐有榘 1764~1845)는 자신의 책 <전어지>(佃漁志, Record of Hunting and Fishing)에서 당시 조선의 건조 청어는 등을 갈라 열지 않고 통째로 볏짚 새끼줄로 엮어서 햇볕에 건조하여 만든다고 설명한다. 서유구는 두 눈이 투명하여 새끼줄로 관통해 꿸 수 있어 이를 ‘관목’이라 부른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변하여 지금의 ‘과메기’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청어를 통째로 말리는 ‘통마리 방식’의 과메기는 소수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주류는 배를 따고 반으로 갈라 내장과 뼈를 제거하여 해풍에 단기간 건조하는 ‘배지기 방식’이다. 통마리 방식으로 만드는 과메기는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게다가 청어는 꽁치보다 더 기름지고 몸통 너비도 커서 말리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꽁치 통마리가 보름이 걸린다면 청어 통마리는 한 달 이상 말려야 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 말린 만큼 맛이 더 진하고 한겨울 통마리 청어 과메기에는 알이 들어있어서 더욱 맛이 좋다.
청어는 구워 먹을 때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굵은 소금을 뿌려 노릇하게 구우면 부드럽고 달며 고소하다.
돌아온 청어

깨끗이 씻은 청어의 비늘을 벗겨낸 뒤 칼집을 넣고 소금을 뿌려 구우면 살이 노릇노릇해지며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된다. 기름진 청어는 구웠을 때 담백함이 증폭되면서도 살이 부드러워 입 안에서 녹는다. 반면 가시가 꽤 많아 번거롭기도 하다.
ⓒSHUTTERSTOCK
청어가 다시 돌아왔다. 올해도 청어가 많이 잡히고 있다. 강원도 삼척에서는 청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어묵, 조림, 튀김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청어 어획량이 늘어난 것은 주로 동해의 수온이 따뜻하게 변화하여 청어의 개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런 연구 결과가 청어를 마구 잡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인다. 북대서양에서 남획으로 인해 청어의 어획량이 급감했던 전례를 볼 때 어린 청어를 잡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970년 노르웨이에서는 남획으로 청어 어획량이 0톤까지 급감했다가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무려 20년이 걸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청어가 정확히 어떻게 무리지어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 게 많다. 청어가 동해로 돌아오긴 했지만 인근의 중국 황해와 일본 북해도에서는 여전히 잘 잡히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잘 모른다. 무분별한 포획보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청어를,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재훈(Jeong Jae-hoon 鄭載勳) 약사, 푸드 라이터